기억 보조 장치
'나' 없는 나의 비약 - 영화 《공각기동대(攻殻機動隊, Ghost in the Shell)》, 1995 본문

영화 《공각기동대(攻殻機動隊, Ghost in the Shell)》, 1995



1-1)
사이보그와 정신 이식 기술이 고도화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SF 작품 역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사이버펑크 작품이다. 시로 마사무네(士郎正宗)의 동명 만화 원작을 바탕으로 오시이 마모루(押井守) 감독의 손을 거쳐 극장판으로 나왔으며, 다양한 작품들에 영감을 주었다. 작품의 연출이나 주제의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이 보기 좋은 작품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도서로는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1976),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Thus Spoke Zarathustra)』(1885),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의 『방법서설(Discours de la méthode)』(1637), 올리버 색스(Oliver Wolf Sacks)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1985), 영화로는 《로보캅(RoboCop)》(1987), 《바이센테니얼 맨(Bicentennial Man)》(1999), 《매트릭스(The Matrix)》(1999, 2003, 2003 트릴로지), 《그녀(Her)》(2013), 《인셉션(Inception)》(2010), 《아일랜드(The Island)》(2005) 등이 떠오른다. 『아키라(AKIRA)』나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1982) 또한 조만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사이버펑크(Cyberpunk)
: SF의 하위 장르로서, '기술력은 높아졌으나 인간의 삶은 낮아지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린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나 인공두뇌학(cybernetics) 등을 소재로 기존 사회 질서나 사상, 관습의 급격한 붕괴나 변화를 다룬다.





1-2)
철학적 SF가 주는 묘한 감각을 특유의 거리낌 없는 연출로 담아내는데, 그로테스크(grotesque), 에로스, 하드보일드(hardboiled), 메카닉, 밀리터리 요소들이 곳곳에서 돋보인다. 특히나 에로스적인 요소가 인상적인데, 영화 시작 지점에서는 "이거 또 일본 만화 특유의 이상한 습관 나오나" 식의 생각이 앞섰으나, 이것이 무미건조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특유의 연출 방식, 사이버펑크의 디스토피아적 설정과 작화 등과 만나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된다. 따지고 보면 에로스적 연출, 노출하는 쪽은 인공물로서 사이보그일 뿐이다. 곧 이 작품에서의 에로스란 단순하게 감각적 쾌락을 주려는 자극제가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에로스를 느끼는 인간의 감정/감각'과 '에로스의 대상' 사이에 인식론적인 괴리를 보여주는 장치다. 오감으로는 실제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로봇이 나온다고 할 때, 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실제 인간에게 느끼는 감정과 완전히 같은 에로스일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의 '신체는 인간처럼 보이나 실상은 로봇 몸이라 점차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에로스' 설정과, 그에 대비되는 영화 《그녀(Her)》(2013)에서의 '인간과 같은 신체가 없는 대상에 대해 증대되는 에로스' 설정이 흥미롭게 대비된다.
1-3)
그 외에 2D 애니메이션에서 담아낼 수 있는 광학적 기교가 탁월한데, 일본 애니메이션의 여러 전성기 중 1990년대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어두운 시간대에 발하는 조명의 빛이나 거울, 유리, 물 등에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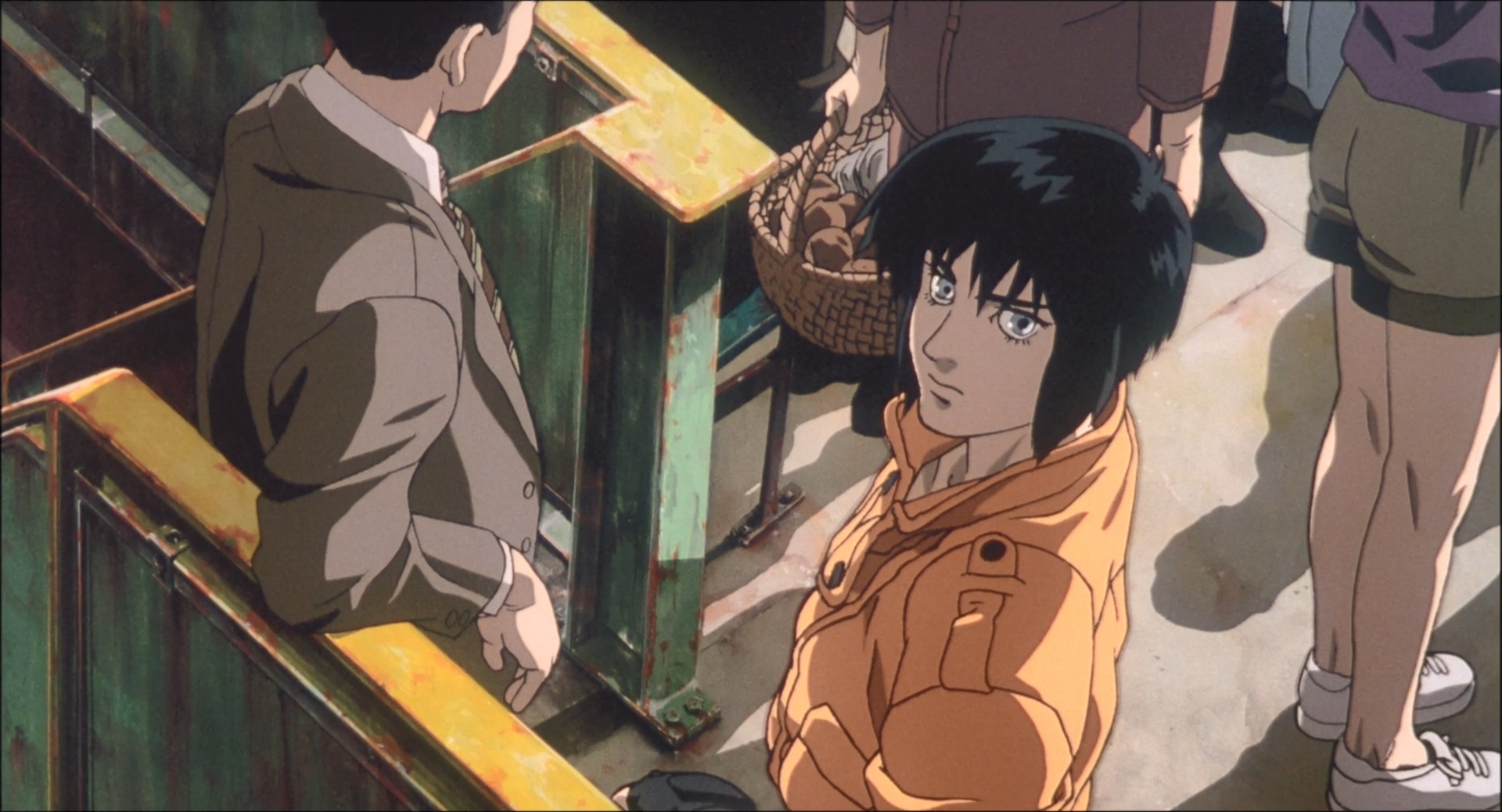



2-1)
SF는 사고실험으로 철학을 하기에 아주 좋은 방식이다. '공상과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분위기로 인해, '공상'을 통해 현실에서의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여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과학'을 통해 이 상상이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며, 미래에는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갖게 한다. 사이버펑크 장르로서 이 작품은 '자아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내 존재 자체를 의심하면서 살지는 않는다. 팔, 다리가 없다고 해서 나는 내 존재를 부정하진 않는다. 눈, 코, 입에 문제가 생기면 생존에 있어서 큰 불편을 겪고, 때로는 심한 좌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최근 로봇공학(robotics)은 팔이나 다리, 눈을 비롯하여 신체의 어떤 부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특정 지체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며, 그 기술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방식처럼, 그 내용이 어떻든지와는 무관하게 '사고를 하고 있는 나' 자체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체의 나머지 부분은 과학 기술에 의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지를 넘어 뇌까지 대체할 수 있는 시대라면, 최종적인 나의 본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특히나, 단순히 나의 존재 자체만을 넘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해주는 핵심을 '기억'이라고 할 때, 작품에 나온 바와 같이, 기억조차 대체되고 조작될 수 있다면 '진짜 나'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추억들이나 어떤 장면들이 그저 만들어진 것이고 주입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로부터 연쇄되는 나의 의지나 열망과 같은 것들조차 그러할 수 있다면 나의 존재 의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인 아닌가. 그저 지금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구분된 정체성을 갈구하는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심각한 불안을 해소해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사이퍼펑크 장르로서 이 작품에서 제시하는 상상력의 세계에서만 이러한 정체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뇌는 기술 발전과는 무관하게 이미 각종 왜곡과 조작을 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편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분명 같은 경험의 재료를 두고서도 사람마다 뇌가 각인하는 인상이 제각각이며, 그에 따른 의미 부여의 방식조차도 제각각이다. 이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1985)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인간의 두뇌와 정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불안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신경과 관련된 병리를 보이는 환자들이 겪는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르며, 이에 따라 자신과 그 주변을 규정하는 내면의 양식마저도 증상에 따라 판이한 모습을 보인다.
2-2)
진핵생물, 세균, 식물 등등... 우리는 대충 어떤 것이 생명인지 알고 있는듯 하지만, 아주 엄밀하게 말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규정하지는 못한다(정상-비정상, 건강-질병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게). 이에 이 작품은 인공적인 존재가 스스로를 생명체라 주장하는 상황을 통하여 '도대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날카롭게 던진다. 어쩌면 내가 가진 스마트폰이, 노트북이, 게임 환경 속에서 움직이는 캐릭터가 미래에 생명체로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어떤 존재의 전 단계일지도 모른다.
무엇이 생명인지를 규정하는 일은 추상적인 작업이지만 우리 현실에 있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사회가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있는 윤리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권리들이 이러한 규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낙태에 관련된 논쟁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서부터 생명인가, 혹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일이 그 이후의 논리 전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던 어떤 존재, 가령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에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면, 이에 따라 생명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 이 개체 집단이 갖게 되는 존재론적 지위가 인간이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이고 법적인 규정들이 딸려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언젠가는 로봇을 파괴하는 행위가 살인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으로는 무엇이 생명인지를 '규정'한다는 말 자체가 그로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윤리니 정치적 권리니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실한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모든 일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무한소급'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를 계속 찾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무한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무한소급이라 한다. 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무한을 끊어내는 최초의 지점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 소중한 이유, 인간이 존엄하며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도 이유의 이유를 계속 요구하다 보면 그러한 무한소급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무한소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생명은 그냥 소중한 것이다', '인간은 그냥 존엄한 것이다'라고만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지적인 겸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한 것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이 그냥 존엄하고 그냥 소중하니까 마음으로도 법적으로도 존중해야 한다면, 인간이 아닌 존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일 수 있겠는가? 아니 어쩌면 인간보다 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의 입장에서는 우습게 여길만한 일일 것이다. 물론 무한소급을 끝내는, 마치 수학에서의 공리와 같은 최종적인 존엄성을 상정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인류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봐왔으니, 현실적인 문제에 비추어서도 이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기도 하다.



3)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곧 스스로를 지키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변화도 없고 도약도 없으며 취약할 뿐이다.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화한다.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겪고 이에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대응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더 잘 적응하는 존재로 변화해간다.
하지만 아무리 변화를 거듭한다고 해도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자체를 극복할 수는 없다. 나의 유전자는 이미 내가 태어난 순간 정해져 있으며, 내가 어떤 지식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든 기본적인 토대로서의 유전자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나의 유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의해서 나는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한 존재'일 뿐이다. 흔히 '내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식의 생각은 큰 의미가 없다. 단순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를 가졌다면 그 존재는 엄밀한 의미에서 '나'일 수는 없고 이미 다른 존재인 것이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른 개체이고 서로 다른 존재인데,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진 존재라면 오죽하겠는가 말이다.
변화 없는 존재의 위험성을 농작물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자. 우수한 맛과 생산력을 위해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종으로만 농사를 짓는다면, 단기적으로는 훌륭한 이익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혹은 능력으로 막지 못한 특정한 전염병에 의해 그 작물이 아예 멸종을 해버릴 수 있다. 실제로도 특정한 환경의 변화나 전염병에 의해 발생한 멸종의 사례가 있으니 다양한 유전자 풀(pool)의 중요성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자기동일성을 강력하게 유지한다는 것과 존재 자체의 한계가 뚜렷해진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특이하게도 이 작품은 사이보그와 같은 기술의 산물로 만들어진 존재가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사이보그든 전자 세계에서의 생명체(?)든 이미 특정한 개체로 존재하는 이상, 그 개체 고유의 특성 자체는 유지된다. 변화하지 않는 강력한 자기동일성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만, 그 안정감의 크기만큼 한계가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작품의 대답은 지금도 세계 곳곳의 유전자들이 하고 있는 바로 그 방식, '번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개체라는 도구를 통해 복제와 변이를 거듭하는 그 방식이다. 작중 벽의 조각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새로운 존재는, 부모와 자식이 다른 개체이듯이, 기존의 나와는 다른 존재다. 새로운 존재로 도약하지만 그 새로운 존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니, 안정적인 의미에서의 자기동일성은 해체된 것이다.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을 멈춰야 비약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작품 감상 > 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들의 일그러진 선생님 - 영화 《우리 선생님을 고발합니다(Ucitelka)》, 2016 (0) | 2020.06.09 |
|---|---|
| 어이가 없기로는 베테랑이지 - 영화 《베테랑》, 2015 (2) | 2020.06.05 |
| 타인이라는 태양을 향한 이카루스 - 영화 《버드맨(Birdman)》, 2014 (0) | 2020.04.21 |
| 유쾌한 시간 도둑들 - 영화 《도둑들》, 2012 (0) | 2020.04.16 |
| 비참함 속에서 빛나는 고결한 영혼 - 영화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 2012 (0) | 2020.04.12 |




